예전에 읽었던 버트런드 러셀의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다. 내용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는다. 일을 열심히 하는게 요즘 덕목이 된 시대에서 왜 게을러도 괜찮은지 설명해준다. 오늘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읽고 생각한 내용들을 적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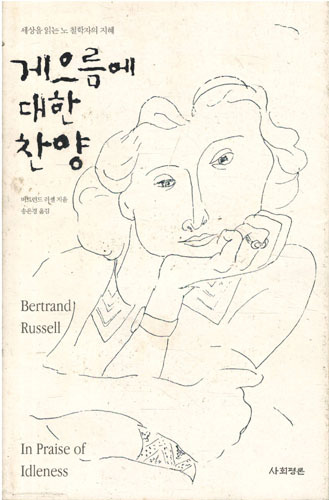
산업혁명
수많은 전쟁,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인류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을 필두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산업혁명 전에 1명이 1명의 소비분을 생산했다고 해보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매일 일을 해야지 자신의 소비분을 생산할 수 있었고, 그 생산분을 다른 물건과 교환(보통은 교환 매개체인 돈을 이용해서)한다. 그 때의 근로시간은 청년은 하루 15시간, 아이들도 하루 12시간을 근로했다고 한다. 주말이란 개념도 없을거니까 사실상 365일 일을 하는거다. 산업혁명 이후 생산성이 폭증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현재는 1명이 10명의 소비분을 생산할 수도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컴퓨팅의 성장으로 그것은 더 가속화 되었으며, 산업혁명때는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쳤다면 무형의 제품인 서비스의 생산성도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옛날 노예가 있던 사회때부터 지배계급은 근로가 미덕이라는, 의무라는 것을 노예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파했다. 또한 종교에서는 근로를 열심히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귀족보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사람이다와 같은 말들을 지배를 위해 사용해왔다. 이런 지배력이 본격적으로 약화된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과거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던 지배계층에서 미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일반 시민들에게도 부여하게 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준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일부 기업과 정부가 미디어와 정보를 통제하려고 하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 착취나 감시 체계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개인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은 크게 확대 되었다.
여가

위에서 옛날에는 지배계급이 노동자들을 지배하기 위해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을 사용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한 이유가 뭘까? 지금에 와서는 여가라는 것이 한정된 자원이 아니다. 여가를 즐기기 위한 물건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여가를 즐기기 위한 자원은 한정적이었으며, 본인들이 여가를 즐긴다면 본인의 소비분을 생산해낼 시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하고, 여가를 전유물화 하기 위해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을 전파했던 것이다. 그들은 실제로 노동자 계급이 여가가 있으면 뭐해? 여가를 줄길줄은 알아?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기술 발전과 노동 시간 단축의 딜레마
공급의 폭증과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보다는 근로 시간이 줄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그것이 충분할까? 왜 그렇다면 실업자는 생기는 것이고, 가나한 사람이 생기는 것일까? 이는 관리자와 노동자 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관리자의 관점에서 먼저 보자. 8시간 근로해서 1명이 10개의 옷을 생산하는 근로자 10명이 있었다. 이 때 기술의 발전으로 1명이 20개의 옷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5명의 근로자를 자르게 된다.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 관점에서도 보자. 같은 조건에서 한 명의 근로자도 자르지 않고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모두 해결된다. 하지만 각 노동자들이 얻는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연 노동자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당연히 임금은 유지하면서 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의 변화
세대
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준다면 어떤 노동자가 좋아할까? 라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 전 세대에 대해서 한정되는 말이다. 나는 요즘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위 말하는 MZ 세대를 일 하기 싫어하는 세대, 꿀 빠는 것만 찾는 세대라고 욕을 하는 미디어들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 내가 보기에는 과거 근로라는 미덕에 갇혀 있는 기성세대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에 비판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기존 지배계급이 보유하고 있던 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세대가 나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라고 생각하는데, 고령화로 노동이 줄고, 수입이 줄고, 경제가 위축되고 ...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투표 파워가 약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투표 파워가 약하다면 정치인들은 고령 세대에 유리한 정책만을 남발할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그들도 지배계급이다. 당연히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을 계속 전파하지 않을까? 지금 세대를 보면 변화를 하고 싶어하지만 외압에 의해 알을 깨고 못 나오는 달걀 같은 느낌이다.
AI

산업혁명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은 못 없앴다. AI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산업혁명은 기계가 도입되었지만 어찌됐든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한 형태였다. 하지만 AI시대는 다르다. 기계가 스스로 생산을 하고, AI가 환경을 조정하고, 사람의 손은 이전보다 훨씬 덜 타게 될 것이다. 괜히 지금 시기와 맞물려 특정 나라에서 기본 소득을 실험해보고, 기본 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10년이 될 지, 20년이 될 지 모르지만 AI가 별문제없이 산업계에 안착하게 된다면 진정으로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